- 미디어 속 낭만이 나를 불순분자로 만들었다
초겨울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쭉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흐름을 감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마감에 쫓겨 며칠 두문불출하다 보면, 다음 외출 시에는 날씨를 이유로 스트레스받게 된다. 뭐야 왜 이렇게 더워. 뭐야 오늘은 또 추운데? 그런 이야기를 혼잣말로 지껄이기 일쑤다. 올해 봄, 그래서 결심했다. 인스타그램의 돋보기를 통해 계절의 움직임을 감지하자고.
나는 당장 봄과 관련된 게시물들에 좋아요를 눌러 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시작했다. 봄에 놀러 갈만한 곳. 봄에 읽을만한 책. 봄에 볼만한 영화들로 알고리즘을 채운다. 작업은 초여름까지 계속됐다. 나는 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생각이 없으니까. (애초에 봄은 싫다. 눈이 붓고 재채기가 나오잖아?) 나는 계절에 충실한 사람으로 기억될 작정으로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있는 거니까. #여름 #초여름 이런 태그를 타고 들어가서 하트를 눌러댄다. 그때는 ‘초여름을 꼭 닮은 플레이리스트’ ‘여름이 담긴 시집들’ ‘6월에 꼭 봐야 하는 초여름 분위기 레전드 영화’ 들을 위주로 학습시켰다. 그랬더니 늦여름부터는 알아서 나에게 계절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게시물들을 업데이트해 주더라. 7월인가 8월 무렵에는 토마토, 능소화, 소다수와 샤워젤 같은 것들이 돋보기를 채웠다. 날이 더워지니 가볼 만한 야외 대신 전시회 추천이 뜬다. 그러면 나는 외출 직전 돋보기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 지금은 밖을 걸어 다닐만한 날씨가 아닌가 봐…
초가을에는 바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없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싶었다. 좋아하는 이에게 조금 더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을 지경이다. “완연한 가을이 즐겁다. 이 가을은 언제 시작된 걸까? OO을 만난 날부터 나의 가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영원히 지속되는 가을은 없는 탓일까? 곧 초겨울이 시작되었고, 나는 다시 옷차림을 신경 써야만 하는 신세로 돌아왔다. 그렇기에 다시 계절의 흐름을 감지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돋보기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돋보기에 ‘낭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보였다.
뭐야? 그러니까 봄 여름 내내 내가 학습시킨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당황스러워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다. ‘같이 해보자, 겨울 낭만’ ‘춥다. 나가지 말고, 안에서 놀자’ ‘겨울, 그 낭만 속으로’ ‘감성 터지는 겨울 영화 10선’ 아하. 낭만이 점철한 게 아니라 겨울이 뒤덮은 거구나. 게시물들의 공통점은 낭만보다는 겨울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낭만이라는 단어가 내 알고리즘에 침투한 것이 못내 거슬렸다. 그래서 이 이상의 분석을 위해, 굳이 굳이 #겨울을 검색해 본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시를 꺼내자’ 하트가 메인 이미지다. ‘지금부터 너랑 꼭 찍고 싶은 낭만적인 사진♡’ 설원에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 ‘당신이 겨울 뉴욕에 가게 된다면’ 뉴욕 거리에 또 둘이 서 있다. 어디 그뿐이랴. ‘서울에서 특별한 겨울 낭만 찾기’ ‘강원도 설경, 낭만으로’ ‘이제 다시 겨울 낭만을 노래하자’ 세 번 정도 스크롤을 내린 뒤 나는 인스타그램을 꺼버린다. 그래, 겨울은 원래 낭만과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미지를 하고 있었구나.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날 밤에는 기분이 구렸다.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구렸다’. 연애감정으로 대표되던 나의 가을이 끝나서, 최근 이어진 과로 탓에 평소의 몇 배로 꼬여 있는 탓일까? 아니, 나의 ‘불순함’을 인지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겨울에 낭만을 이야기한다.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나는 그게 왜 낭만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겨울에 눈밭에서 설정샷 찍는 게 낭만이야? 겨울에 서울 카페 찾아다니는 게 낭만이야? 겨울에 둘이 꼭 붙어 사진 찍는 게 낭만이야? 나는 ‘낭만이 뭔데? 왜 그러는데?’ 라는 의문에 봉착한다. 사람들은 모두 겨울과 낭만을 연관 짓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마무리한다. 그러나 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 인스타그램이라는 바닷속에서 나는 불순분자였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계절의 흐름을 외출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으로 감지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지구에서 불순분자 같은 아이디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때?)
- 낭만파랑 뭐가 다른건데
나에게 가을을 가져다주었던 이와 대화하던 중, 낭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다. 그래서 물었다. 낭만 VS 현실. 밸런스 게임 고고. 같은 거. 이때도 낭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낭만을 아는지 모르는지보다 그의 생각이 더 궁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데 더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핸들 쥔 채로 대답했다. “낭만을 따라갈 현실적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해.” 뭔가 멋있어 보였던 것 같다.
어쩌면 나에게 낭만을 공부하기에 이보다 좋을 때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불순분자됨을 이해했고, 직전에 함께했던 이는 낭만에 관해 이야기했었다. 그래, 공부하자. 모르면 공부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선은 다른 미디어를 찾아갔다. 나름 디자이너니까 일단은 언스플래쉬 먼저 손이 갔다. 최대한 시각적인 방식으로 이 의문을 해소하고 싶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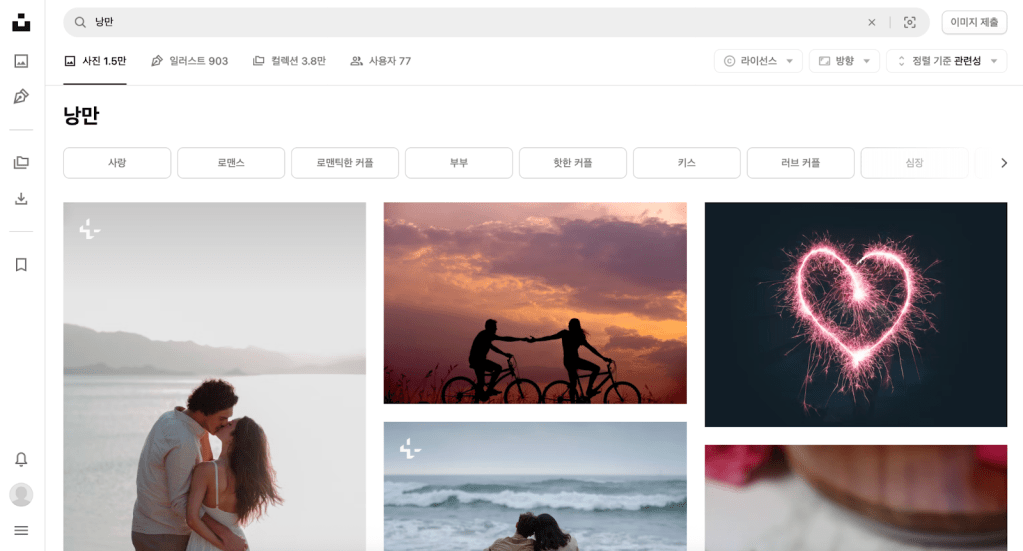
연관검색어부터 나를 힘들게 했다. 사랑 로맨스 로맨틱한 커플 부부 핫한 커플 (핫한 커플이 대체 뭔데?) 키스 러브 커플 심장. 사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전히 모르겠다.
낭만이 뭔지 ‘정말 모른다면’, 방금 언스플래쉬에 나온 사진들을 보고 나는 글쿤. 하고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어떤 찝찝함이 남는다. 이 찝찝함은 인지부조화일 것이다. 내가 기존에 낭만의 어떤 의미를 학습한 경험이 있으며, 내가 알고 있는 낭만과 이 결과들이 조화롭게 섞이지 않는 데서 오는 찝찝함. 그래서 나는 내가 조금이나마 배워본 적 있는,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생으로서 학습한 낭만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낭만파 미술”을 검색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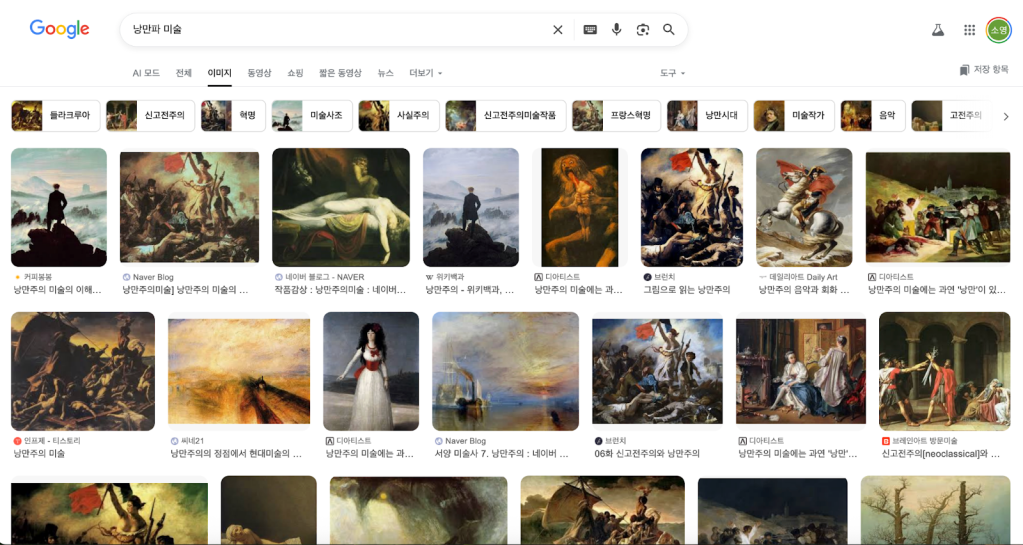
와 그림 미쳤다. 몇 학년 몇 학기 무슨 수업에서 배운 무슨 작가 작업이당.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다. 저거 고삼때 내 폰 배경이었는데… 뭐 그런 실없는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를 낭만이라는 주제로 돌려낸다. 이게 내가 학습한 낭만파였다. 직전에 인스타그램과 언스플래쉬에서 본 것들과는 꽤 시각적으로 달랐다.
이제는 소설로 가본다. 이동진 평론가가 ‘이동진의 빨간책방’ 낭만주의와 리얼리즘 편에서 낭만파의 모습을 오롯이 담고 있다고 평가했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베르테르를 떠올린다. 그는 약혼자 있는 여인을 사랑하다가 자살한다. (내가 너무 많이 생략했긴 하지만 이게 소설의 훌륭한 한줄요약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당신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건 바보짓이야, 저것이 올바르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야만 직성이 풀리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절박함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아, 또 있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곡. 궂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릴 들어보렴. (…)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뱃고동 소릴 들어보렴. (…) 내헤에 가슴헤~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 만에 대하여.” 그러니까 가수가 낭만에 대해 내린 결론은 옛날식 다방에 앉아 첫사랑 그 소녀를 떠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못 올 그것들이 낭만이라는 건지.
사랑, 로맨스, 커플의 사진을 두고 미디어에서는 낭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 그림들은 낭만’주의’래.
비극으로 대표되는 베르테르도 낭만주의라고 그래.
다시 못 올 것도, 그걸 떠올리는 건 낭만주의가 아니고 낭만이고?
사실과 사실주의의 의미는 닮아있다. 고전과 고전주의의 의미도 닮아있다. 그런데 낭만과 낭만주의는 아닌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을 헤집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워진 나는, 이 무렵 미디어가 논하는 낭만과 대학에서 학습한 낭만주의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는 낭만과 낭만주의가 동음이의어처럼 느껴질 지경까지 온다.
- 낭만의 뿌리를 찾아서
그렇다면 내가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의 뿌리를 찾는 일이다. 당장 책을 꺼내고, 검색을 시도했다. 아래는 내가 탐독하고 검색하여 이해한 낭만이 낭만이 된 과정을 쉽게 풀어본 것이다 :
- 원래 roman은 라틴어 이외의 유럽 언어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등- 을 뭉뚱그려 일컫는 말로 쓰였음.
- 당시 사용되는 언어는 크게 라틴어와 roman 으로 구분함.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회 성직자, 지식인들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갖춘 이들이었으며, 종교의식과 학문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음. 이때 일반 주민들은 라틴어 이외의 언어들 – 즉 roman을 사용함.
-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roman 을 사용해 쓰인 문학이나 예술이 성행함.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들과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 보니 주로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용맹한 기사도 이야기 등등의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음. 곧 roman은 roman을 사용해 쓰인 문학 작품을 부르는 말로 굳어짐.
- 이 roman이 일본으로 건너가 浪漫이 됨. 일본식으로 음차하는 과정에서 ‘흩어지다, 제멋대로 하다’라는 의미의 浪 과 ‘방탕하게, 제멋대로’라는 의미의 漫이 쓰임.
- 그것이 마침내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도달 – 3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 미디어 속 낭만의 이미지를 가지게 됨.
3의 과정이 바로, 미디어 속 낭만이 사랑으로 점철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소시민, 대중, 일반 주민의 언어로 쓰였기에 라틴어로 작성된 문서들보다 미시적이고 감정적이다. 인간의 감정과 일상을 담다 보니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치인 사랑과 연애, 애정 같은 이야기가 로만 소설을 대표하게 된다. 이 흐름은 마치, 망설임 없이 앞으로 향하기 위한 합리주의가 아니라 감정과 사랑이 비로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하는 것같이 느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뇌 속 사전에 등재된 ‘미디어 속 낭만’의 정의를 공유하겠다 :
- 제멋대로 굴고픈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마음의 상태. 혹은 그런 분위기.
- 제멋대로 굴고 있는 인간 혹은 그런 마음의 상태.
- 제멋대로 사랑하여 삶을 풍요히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제대로 이해할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낭만의 사전적 의미와도 나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믿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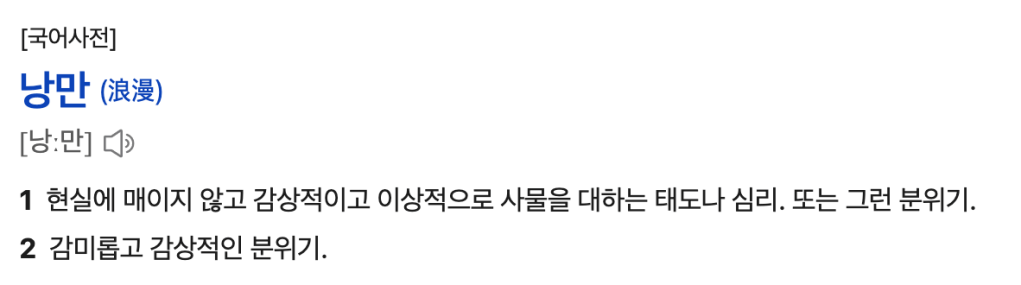
새로이 ‘미디어 속 낭만’의 정의를 결론 내리니 떠오르는 곡이 한 곡 있다. 비틀즈의 octopus’s garden.
“I’d like to be under the sea In an octopus’s garden In the shade
We would be warm below the storm In our little hideaway beneath the waves
Resting our head on the seabed In an octopus’s garden near a cave
We would sing and dance around Because we know, we can’t be found”
“바닷속 그늘 아래 문어 정원에 있고 싶어
파도 아래 작은 은신처에 있으면 우린 분명 따듯할 거야
동굴 옆 문어 정원에서, 바다 침대에 누워 쉬면서 말이야
우리는 노랠 부르고 춤을 출 거야.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문어는 좋아하는 것들을 바다 한구석에 모아 정원을 만든다고 한다. 작사한 링고 스타는 그러니까, 문어처럼 함께 물 밑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두고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인간은 물 밑에서 살 수 없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그런데도 문어처럼 둘만의 공간에서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자고 한다. (물론 비유겠지만) 새로이 정의한 낭만에도, 낭만의 사전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roman으로 작성된 소설의 내용이 이랬을까? 싶기도 하다.
4. 미디어 속 낭만으로
미디어에서 논하는 낭만이 대부분 사랑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이제는 인스타그램 돋보기를 가득 채운 낭만과 사랑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도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다. 나의 ‘불순분자 됨’ 또한 이제는 조금씩 희석되어 가는 것만 같다.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대한 지식이 한가지 늘었다는 건 기쁘다. 지식을 늘려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의 일부니까.
일본 가수 아이묭의 노래 중 Till i know what love is(I’m never gonna die)라는 노래가 있다. 사랑을 알기까지는(절대 죽지 않겠다) 로 직역될 수 있는 곡이다. 가사는 이렇다 :
無茶苦茶に走り続けた身体を今休めて
交わることのない誰かと巡り合い無限に広がる雲に乗って見たことのない虹を見たい
愛を知るまでは死ねない私なのだ
導かれる運命頼って今日も明日も生きて行こう
엉망진창으로 달린 몸을 이제 쉬게 해
어울릴 일 없는 누군가와 우연히 만나 한없이 펼쳐진 구름을 타고 본 적 없는 무지개를 보고 싶어
사랑을 알기까지는 죽을 수 없는 나니까
이끌어주는 운명에 의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자
어떤 강한 의지를 선언하는 것 같다. 사랑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도, ‘제멋대로 굴고픈’ 마음을 내비치는 것도 내게는 또 낭만같이 다가온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일은 솔직히 피곤하다. 티벳여우처럼 피곤하다. 비단 오늘만의 일도 아니다. 하고 싶은 것 하나를 하려면 하기 싫은 것을 열 개는 해야 하는 게 인간이고, 나는 평생 피곤하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다. 마치 냉소처럼. 냉소와 비관은 쉽다. 사랑과 긍정은 어렵고.
허나, ‘미디어 속 낭만’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니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삶에 쫓을 낭만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졌다. 낭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나도 죽고 싶지 않아졌다. 지금 나라는 문어의 정원에 있는 게 뭔지 돌아보게 된다. (여행 가서 우연히 산 반지랑 노트북 한 대 뿐이라 조금 슬퍼진 건 비밀이다.)
스물여섯, 이십춘기다.
낭만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나 또한 지금 선언한다.
5. 덧붙이며
유독 다른 매체의 도움을 많이 받아 작성한 호가 되었다. 나에게 낭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 모든 창작물에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덧붙이자면, 모두에게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을 권해본다. 인류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친 32가지의 사상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는 책인데, 엄청나게 재미있는 인류사 겉핥기를 하는 느낌이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에, 지식 흡수를 위해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즐거운 경험을 위해 제안한다. 한 번에 32개의 사상을 연속적으로 때려 넣다 보면 자연히 자신의 취향이 보인다. 아, 나는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 하나하나 따로 읽으며 생각하는 것보다, 32개를 한 템포에 읽었을 때 호불호에 대한 경향성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 호불호들의 공통점을 찾아가다 보면 자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데, 나는 그게 퍽 즐거운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다. 당신에게도 그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다. 거듭 말하지만, 지식을 늘리는 행위는 사랑의 일부니까.
언스플래쉬에서 낭만을 검색했을 때 나온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들던 사진을 공유하며 마무리한다. 그럼,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기를.



신소영
rubysnow@naver.com
